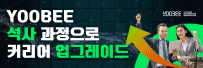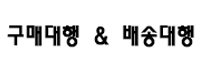갈등과 혼란 여전한 ‘와이탕기 조약’
2월 6일(목)은 ‘와이탕기 조약(Treaty of Waitangi)’ 체결을 기념하는 ‘와이탕기 데이’로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이다.
이날은 뉴질랜드라는 국가를 만든 계기가 된 날이지만 조약을 체결했던 1840년 이래 지금까지 조약의 해석과 적용 등을 놓고 원주민인 마오리와 정부 및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국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중 한 축인 ACT당이 주도하는 조약 재해석과 새로운 법안 도입을 놓고 국가적인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올해 와이탕기 데이를 맞아 그 기원이 된 와이탕기 조약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최근의 갈등 상황 등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와이탕기 조약 문서
와이탕기 조약 문서
<와이탕기 조약이란?>
유럽인으로서 뉴질랜드 땅을 처음 접했던 이는 1642년 12월 남섬 인근에 도착했던 네덜란드 탐험가인 ‘아벨 태즈먼(Abel Tasman)’이다.
그는 처음에는 이곳을 자기 나라 의회 이름을 가지고 ‘스타텐 란트(Staten Lante)’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네덜란드의 한 지역인 ‘젤란트’의 이름을 따라 ‘새로운 질란디아’라는 뜻의 ‘노바 질란디아(Nova Zeelandia)’로 고쳐 불렀다.
‘젤란트(Zeeland)’는 네덜란드 남서부 지방으로 ‘바다의 땅’이라는 뜻이며 ‘Nova Zelandia’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당시 유럽에서는 새로 발견된 땅에 라틴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태즈먼은 실제 이곳에 상륙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1769년에 지금의 기스번 부근에서 뉴질랜드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유럽인은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 일행이다.
쿡 선장이 당시까지 불리던 ‘노바 질란디아’를 영어식인 ‘뉴질랜드’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국명이자 지명이 됐다.
쿡 선장의 도착 이후 1790년대부터 어부들을 중심으로 유럽인의 발길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로 뉴질랜드 주변 바다에 널리 서식하는 고래를 잡기 위해서였다.
당시 고래는 석유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문명 세계에서 산업용이나 조명용 기름은 물론 여성의 화장품에까지도 활용되는 그야말로 버릴 게 거의 없는 살아있는 귀중한 자원 덩어리였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점차 북반구 바다에서는 고래잡이가 힘들어지자 포경선이 남반구로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배후기지로 뉴질랜드가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도 뱅크스 페닌슐라의 아카로아(Akaroa)를 비롯한 뉴질랜드 해안의 여러 도시에는 고래기름을 끓이던 대형 솥이나 작살 등, 이들 도시가 당시에는 포경선이 머물던 기지였음을 증명해주는 유물로 공원을 장식해 놓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선원 외에도 상인과 무역업자는 물론 농민과 선교사까지 합세하면서 이곳에 정착하는 유럽계 이주민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1839년 무렵에는 그 숫자가 2,0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토착민인 마오리 인구는 11만 5,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이들 이민자 간에는 물론 이민자가 마오리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폭력을 포함해 불법행위까지 급증하면서 혼란이 날로 커지자 영국 정부는 1833년에 제임스 버스비(James Busby)를 치안 담당인 ‘현지 주재관(British Resident)’ 자격으로 임명했다.
그러던 중 1835년부터는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의 막강한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인의 정착이 본격 시작되고 프랑스가 이곳을 아예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그러자 영국은 뉴질랜드가 영국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840년에 영국 해군의 윌리엄 홉슨(William Hobson) 선장을 부총독으로 보내 마오리 부족장들과 이른바 와이탕기 조약을 맺게 했다.
1840년 2월 6일 북섬의 베이 오브 아일랜즈에 있는 와이탕기에서 43명의 북쪽 부족장이 먼저 서명을 마친 이 조약은 그 후 7개월에 걸쳐 전국을 돌면서 500여 명 이상의 각 지역 부족장의 서명을 받아 완성됐는데, 당시 서명자 중 최소한 13명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뉴질랜드는 영국 왕실의 직할 식민지 시대를 거쳐 1907년 영연방에 속한 ‘자치령(Dominion)’이 됐다가 1931년에는 ‘영연방 회원국(British Commonwealth)’이 됐다.
또한 영연방 국가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 ‘웨스트민스터법(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이 1947년에 뉴질랜드 자치의회를 통과하면서 정식으로 영국 의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영국 여왕을 명목상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의 독립국으로 탄생했다.
( 와이탕기 조약이 체결된 건물
와이탕기 조약이 체결된 건물
<조약의 내용과 문제점>
과거 제국주의 시절 영국과 식민지 사이에 맺었던 조약 대부분이 사문화된 것과는 달리 이 조약은 지금까지도 뉴질랜드 법과 사회의 근간으로 남았는데, 그러나 문구 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영어와 마오리어로 전문과 함께 총3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이 조약은 사전에 법률가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지도 않았고, 또한 두 개 언어별 버전에 따라 해석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해 현재까지도 마오리와 정부 간에 논쟁이 계속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로 당시 1월 29일 뉴질랜드에 도착했던 홉슨 부총독 일행이 불과 며칠 뒤인 2월 6일에 조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내용이 급조됐으며, 또한 선교사와 그의 아들이 영어를 번역해 마오리어 버전을 만들다보니 조약 내용은 둘째치고 사용된 단어와 문구에 대한 양자 간의 해석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조약 첫 번째 조항은 ‘통치권에 대한 것’으로 영어 버전에는 ‘주권(sovereignty)’을 영국 왕실에 넘긴다고 했지만 마오리 버전에서는 그들의 ‘카와나탕가’(kawanatanga)를 넘긴다고 했다.
고유 문자가 없는 데다가 당시까지 주권이라는 단어 자체와 개념이 없었던 마오리는 영어의 ‘governor’를 소리나는 대로 써서 ‘카와나’라 칭했고, 이는 결국 주권보다는 지배나 관리에 해당하는 ‘governance’에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오리는 모든 토지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조약 체결 후 채 얼마 지나지도 않은 1843년부터 양측 간에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전쟁까지 치르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
‘뉴질랜드 전쟁(NZ Wars)’은 역사적으로 1845년부터 1872년까지 벌어진 것을 지칭하며 전쟁 기간에 수천 명의 마오리가 희생됐으며 영국군을 포함해 유럽계도 천여 명 가깝게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쟁은 이전에는 ‘토지 전쟁(Land Wars)’ 또는 ‘마오리 전쟁(Māori Wars)’으로도 불렸는데 이 과정에서 마오리는 결국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를 동원한 영국 측에 진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과 뉴질랜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 지난 1975년에 와서야 와이탕기 재판소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당시 강탈당했던 일부 토지를 실제로 마오리 부족에게 반환하기도 했다.
두 번째 조항은 ‘티노 랑가티라탕가(Tino Rangatiratanga)’ 또는 족장 제도와 연관되는데, 마오리 버전에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타옹가’(Taonga, 보물) 소유에 대한 더 넓은 권리를 약속하고 있으며, 영어 버전에는 마오리에게 토지와 임야, 바다(어장),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오리 버전에서 사용한 ‘타옹가’라는 말이 영어 버전에서 사용된 법적인 재산(properties)을 의미하는 용어보다 훨씬 폭넓게, 언어와 전통, 지식, 의식 등 문화와 가족, 나아가 특정한 장소 같은 비물질적 자산의 소유와 보호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오리어 보존 정책과 함께 정부기관 명칭을 마오리어로 먼저 표기하는 방식을 두고 집권한 국민당 연립 정부와 마오리 단체가 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이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세 번째 조항에서는 마오리에게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권리와 함께 영국 시민과 동일한 보호를 약속했지만 이후 실제로는 차별과 불평등이 있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쟁에 대한 책
뉴질랜드 전쟁에 대한 책
<와이탕기 데이 제정>
와이탕기 조약 체결 기념일은 1934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후 마오리의 권리 회복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인 1974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뉴질랜드 전역에서 ‘와이탕기 데이’로 불리게 됐다.
마오리 공동체는 조약이 단순히 역사적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현대 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다.
이 날은 조약 체결을 기념하면서 뉴질랜드의 역사적 정체성과 마오리 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자리 잡았다.
매년 와이탕기에서 공식 기념식이 열려 전통 마오리 공연과 환영 의식(Pōwhiri)이 진행되며, 각 지역에서도 마오리 공회당인 마라에(Marae)를 중심으로 음악 공연, 마오리 전통 음식 축제, 토론회 등 다양한 문화적 행사가 열린다.
<와이탕기 분쟁 재판소(Waitangi Tribunal)>
와이탕기 조약에서 마오리는 영국 신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으로는 마오리는 많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
이는 특히 토지 매매 과정에서 심각해 1860년대에는 와이카토와 타라나키 등 북섬 중앙부를 중심으로 마오리 토지 전쟁이 대규모로 발발해 수년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마오리가 희생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19~20세기에 걸쳐 많은 마오리 부족이 부족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상실했는데, 그중에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친 경우도 많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마오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75년 뉴질랜드 정부는 와이탕기 분쟁 재판소를 설립했으며, 이 법정에서 마오리 부족의 요구에 대해 금전 지불이나 땅의 형태로 보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중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재판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결로 내려지는 보상은 대부분 해당 부족민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다.
한편, 1984년 당시 집권당이던 노동당 정부는 마오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을 18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노동당 정부에 의해 입법된 해저, 해안법에 대해 집권당 내에서도 큰 갈등이 일어났으며, 이는 당시 집권당의 마오리부 장관이던 투리아(Turia) 의원이 탈당해 새로운 마오리 정당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약원칙법안 반대 시위
조약원칙법안 반대 시위
<ACT당의 ‘조약원칙법안’ 도입 시도로 수 만명 시위 벌여>
지금은 조약이 맺어졌던 장소가 유명한 관광지가 됐지만 실제 조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데, 수년 전 나온 한 조사에서는 조약 체결 연도를 아는 사람이 34%에 불과했으며 이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 조약이 무용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며, 특히 비마오리계에서는 조약으로 인해 오히려 인종 간 갈등이 조장된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몇년 전 실시된 한 조사에서 비마오리계는, 자신을 ‘뉴질랜드 국민’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마오리계는 34%가 자신을 개별적인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서야 뉴질랜드 국민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조약과 뉴질랜드라는 국가에 대한 의식에는 민족별로 큰 의식의 차이가 있다.
한편 2004년에 국회에서 와이탕기 기념일을 ‘뉴질랜드 데이’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실제로 1970년대에는 2년간 명칭이 ‘뉴질랜드 데이’로 공식적으로 변경된 적도 있다.
매년 와이탕기 데이 때면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참석해 조약 체결 장소에서 기념행사가 열리지만 1998년에 노동당 헬렌 클락 총리가 연설을 거부당한 것은 물론 2004년에는 국민당의 돈 브래시(Don Brash) 대표가 진흙 세례를 받는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소동이 여러 차례 벌어진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익 정당인 ACT당은 와이탕기 조약이 현대 뉴질랜드 사회의 법과 정책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특히 공공 서비스와 자치권 요구에 타옹가를 적용하려는 마오리의 주장이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T당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조약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양한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는 조약의 원칙을 재정의함으로써 조약 자체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마오리의 자치권과 토지 및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조약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마오리당은 물론 노동당과 녹색당이 반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위티 마이피-클락(Hana-Rāwhiti Maipi-Clarke) 마오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 사본을 찢고 하카(Haka)를 춰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뉴질랜드 국회에서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지만, 국민당이 두 번째 독회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법안의 최종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 자체가 국민 사이에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마오리의 권리와 뉴질랜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갈등 속에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마오리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에 일주일에 걸쳐 전국을 가로지르는 항의 행진인 이른바 ‘히코이(Hikoi)’가 벌어졌다.
이후 4만 2,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웰링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이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됐다.
뉴질랜드의 브랜드 신뢰도 연례 조사에서도 와이탕기 재판소가 가장 믿을 수 없는 정부기관의 하나로 꼽히는데, 이처럼 와이탕기 조약은 건국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불신받는 역사적 유물이기도 하다.
반면에 이 조약은 영국이라는 당시 제국주의 최강국과 식민지 원주민이 단일 조약을 통해 한 국가를 형성한 역사상으로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는 사실로 지금도 역사학계를 비롯한 관련 학계와 정치와 법률계에서는 매우 특별한 사례로 거론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특이성을 감안해 지난 1997년에 유네스코는 모두 7장의 종이와 2장의 양피지로 구성된 조약 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KR]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Waitangi’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Waitangi’
<와이탕기 조약 체결 장면을 묘사한 그림은?>
위 그림은 와이탕기 조약 체결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Waitangi’로 작가는 뉴질랜드 출신의 마커스 킹(Marcus King, 1891~1983)이다.
뉴질랜드 정부 의뢰로 홍보용으로 1938년 제작했는데, 타라나키에서 태어난 킹은 생전에 뉴질랜드 풍경과 역사적 장면을 많이 그렸으며 풍경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와 그림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 작품은 조약 체결 장면을 이상화했는데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오리와 영국 정착민 간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강조해 전통 의상을 입은 마오리 족장이 정장 차림의 영국 관리와 함께 서명하는 순간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뉴질랜드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됐지만 조약 체결 당시의 긴장감과 마오리의 우려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평화롭고 이상화된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림에서 마오리의 입장이나 조약 체결의 복잡한 맥락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작품은 와이탕기 조약 교육 및 홍보 자료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마오리 관점과 당시의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대안적인 작품이나 역사적 해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현재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산하의 ‘알렉산더 턴블 도서관(Alexander Turnbull Library)’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