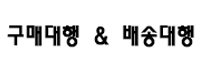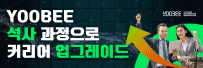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달래 냉이 씀바귀...
춥고 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김장이었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짜게 담가야 했다. 무는 뿌리를 씻어 통째로 동치미를 담그거나 네 가닥 정도로 쪼개어 김치를 담갔다. 뿌리를 먹기 위해서는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짚을 깔아 차곡차곡 포개어 놓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얼지 않도록 덮어 두었다가 겨우내 하나씩 꺼내 먹었다.

무의 청은 엮어서 비가 들지 않게 양지쪽 처마 밑에 매달아 놓으면 마른다. 조금씩 걷어 삶아 우물가의 옹기에 담가 우려내고는 쫑쫑 썰어 국을 끓였다. 띠포리를 한 줌 넣고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시락국을 끓이면 정말 맛있었다. 멸치보다 큰 띠포리는 번득이는 비늘이 있으며, 내장이 적어 쓴맛이 나지 않아 국물을 내기에 딱이었다. 게다가 값도 쌌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주 큰 멸치를 띠포리라고 불렀는데, 사전에는 밴댕이의 사투리라고 나온다. 그때는 띠포리를 우려서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먹었는데, 퉁퉁 불어 맛이 다 빠진 띠포리였지만 생선처럼 즐겼다. 생선이 귀했으니 그것도 생선이었던 것이다. 배추 시래기보다 무 시래기 국이 더 맛있었던 것 같다.
김장김치가 많으면 썰어서 밥을 넣고 끓여 국밥을 만들었다. 이를 밥국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매콤하고 칼칼하여 해장국 같지만, 그때는 밥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했다.
어느새 3월이다. 산골에서 자란 나는 겨우내 김치와 시락국을 먹고 지내다가 봄이 되어 싱싱한 봄나물을 맛보면 몸이 먼저 알고 반응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 덕분에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월 대보름이면 아직 추워 나물이 나오기 어려웠다. 양지바른 밭에 봄동을 심어 볏짚을 덮어 두면 겨우 목숨만 부지한 상태라도 아주 맛있었다. 3월이 되면 가장 맛있는 것이 바로 쑥부쟁이 나물이었고, 달래를 잘게 썰어 간장 종지에 넣어 먹는 달래장이었다.
파와 맛이 비슷한 달래는 강한 향으로 봄맛을 전하곤 했다. 양지쪽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5cm 정도 자란 쑥부쟁이를 캐어 데친 뒤, 꽉 짜서 물기를 빼면 한 소쿠리를 삶아도 한 움큼밖에 남지 않는다. 여기에 된장을 약간 풀고 참기름을 섞으면 일미다. 나물의 향을 즐기기 위해 된장이나 간장 대신 소금과 참기름, 깨소금만으로 무치기도 한다. 이 쑥부쟁이 나물을 ‘부지깽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냉이를 뿌리째 캐어 된장국으로 끓이면 씹는 맛이 좋았다.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혈액순환을 돕고 간 기능을 좋게 하며, 눈을 밝게 해 준다고 했다. 이른 봄 싱싱한 나물을 먹으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쓴맛이 나는 씀바귀는 고들빼기를 닮았다. 요즘은 고들빼기를 더 많이 먹지만, 쓴맛이 나기는 서로 비슷하다. 입맛을 돋우는 데는 제격이었다.
달래, 냉이, 씀바귀를 더해 부르는 동요가 있다.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너도 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달래 냉이 씀바귀 나물 캐오자.
종다리도 높이 떠 노래 부르네~”
친구들과 이 동요를 부르며 즐겁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난다. 노란 원추리꽃은 여름 내내 피지만, 이른 봄에 나는 보드라운 잎은 베어서 삶아 우려낸 뒤 나물로 먹었다. 싱싱한 채소가 귀했던 시절이라 얼마나 맛있었던지 모른다. 이를 경상도 사투리로 ‘기새’라고 불렀다. 이어서 쑥이 나고, 고사리가 나고, 산에 가면 취나물이 나지만, 2월 말~3월 초의 날씨에는 역시 달래, 냉이, 씀바귀, 쑥부쟁이가 최고였다. 어촌에서는 쓴맛이 나는 쑥을 도다리와 함께 끓여 ‘도다리 쑥국’을 즐기기도 한다. 잡아서는 안 되지만, 알이 밴 도다리를 넣고 끓인 쑥국은 보약 같았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으니, 부유하고 고귀할지라도 의롭지 않은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으니라.”
반소사음수(飯疏食飮水) 곡굉이침지(曲肱而枕之) 낙역재기중의(樂亦在其中矣) 불의이부차귀(不義而富且貴) 어아(於我) 여부운(如浮雲).
“반소식”이 아닌 “반소사”는 쌀밥은 커녕 보리밥이나 조밥만도 못한 거친 밥을 뜻한다.
3~4월이면 먹을 것이 떨어져 새 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를 곯는 ‘보릿고개(춘궁기; 春窮期)’가 있었다. 거친 밥에 이것저것을 다 넣어 먹었다. 그나마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시절이다. 이때 푸성귀가 구황(救荒)의 역할을 했다.
“불의이부차귀(不義而富且貴)”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를 뜻한다.
부정한 수단으로 큰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거머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까?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한 삶을 ‘안빈낙도(安貧樂道)’라고 한다. 가축을 기르고 어로를 해서 먹기는 했지만, 우리의 이빨과 긴 창자를 보면 원래 채식을 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밥에 나물과 김치만 있어도 충분한데,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황금과 권력을 쫓는다. 그것을 어찌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뜬구름이 아닌 것이 없는데, 죽어서도 *시지프스(Sisyphus)가 되고 싶은가?
* 출처 : FRANCEZONE
* 시지프스(Sisyphus)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교활하고 잔꾀가 많아 신들을 속이다가 벌을 받은 코린토스의 왕이다.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죽은 후 저승에서 끊임없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는데, 정상에 도착하면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영원히 반복된다.
이 이야기는 끝없는 고난과 무의미한 노동을 상징하며,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를 부조리한 인간 존재의 메타포로 해석했다.

■ 조 기조(曺基祚 Kijo Cho)
. 경남대학교 30여년 교수직, 현 명예교수
.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 기고
.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출간 (공저)
. 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비상근 이사장으로 봉사
. kjcho@uok.ac.kr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