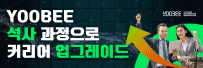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길 위에서 만난 마음
김천 직지사-명적암-중암

3월이 코앞이다. 봄이 오고 있다는데, 어디쯤 오고 있을까? 겨울이 길었던 탓인지 괜히 안달이 나서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직지사(直指寺)로 향했다.
절은 산에 있어 좋다. 게다가 한국의 명산과 명당은 몽땅 전통사찰이 차지하고 있으니, 절로 가는 길은 곧 명산으로 가는 길이요 명당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일주문을 지나 사천왕문을 통과하자 큰 누각이 나온다. 만세루(萬歲樓)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인근 일대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다고 한다. 구한말 화재로 만세루와 함께 소실되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만세루 앞에 천년이나 묵은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직지사에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조선 명종 때였다. 당시 직지사 주지였던 신묵대사(愼默大師)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누런 용 한 마리가 만세루 앞 은행나무 아래 똬리를 틀고 있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대사는 꿈이 심상치 않아 직접 나가 보았다. 과연 나무 아래에 한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대사는 그 아이를 거두어 출가시키고 불법을 가르쳐 승과(僧科)에 급제시켰으니, 그가 바로 훗날 임진왜란 때 나라와 백성을 구한 사명대사(四溟大師)다. 사명대사의 속가 고향은 경남 밀양이지만, 스님으로서의 고향은 이곳 직지사인 셈이다.
만세루를 지나 대웅전 마당에 서자 산과 사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황악산(黃嶽山)!
소백산맥 준령에 서린 제법 품이 너른 산이다. 아직 겨울이니 섣부른 생각 말라며 경고라도 하듯 넓게 펼친 산마루가 어깨까지 하얗다.
“너무 성급했나?”
잔뜩 부풀었던 기대를 접고 대웅전에 참배하고 나서 천불전으로 향하던 참이었다. 관음전 뒤쪽 볕 바른 둔덕에 붉은 꽃이 흐드러졌다. 홍매화다. 역시, 봄은 여기 있었다. 흐뭇한 마음에 어린아이 입술처럼 봉긋한 꽃봉오리로 다가가 한참 바라보았다.
“그래, 이미 봄이니 움츠리지 말자!”
봄을 찾았으니, 이젠 봄을 즐길 차례다. 갑자기 걷고 싶어졌다. ‘사명대사 명상길’을 걸을까? 산 내 암자로 두루 연결되는 ‘운수암 옛길’을 걸을까? 뭐 얼마나 걷겠냐 싶어 짧은 길을 선택했다.
대웅전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솔숲이 나타났다. 쭉 쭉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는 언제봐도 늠름하다. ‘추운 계절이 닥쳐야 소나무 잣나무가 잘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했던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꿋꿋한 기상이 과연 사명대사를 연상케 한다. 소나무 사이로 난 길은 잘 다듬어져 걷기 편하다. 그 길을 따라 태봉(胎峯)에 올랐다.

사방으로 산들이 연꽃처럼 에워싼 것이 누가 봐도 명당(明堂)이다. 예전 이 자리에 조선 2대 왕 정종(定宗)의 태실이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이리저리 흩어져 나뒹구는 기단석 몇 개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설하고 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왔는데도 채 20분이 걸리지 않는다. 기대 이상의 풍광을 감상한 탓인지, 멈추기엔 아쉬웠다. 게다가 산은 멀리서 보는 풍경도 좋지만, 속살을 더듬어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큰맘 먹고 가까운 암자까지 걸어보기로 했다.
산 내 암자로 이어지는 옛길은 천불전 서쪽에서 시작된다. 극락전을 감아 도는 개울을 따라 산으로 향한 길이 암자로 가는 길이다. 두셋이 나란히 걸을 만큼 초입은 제법 넓다. 검은 바위를 가린 새하얀 물살을 보며 얼마쯤 걷자, 큰 목욕탕만 한 소가 나타났다. 용이 산다고 용소(龍沼)라 부른단다. 시퍼런 빛이 제법 속에 용이 살 듯도 싶다. 하지만 부화(浮華), 겉치레가 좀 심하다. 이 정도 못에 용이 살 것 같으면 천하에 용이 넘쳐나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를 작명가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발길을 재촉했다.

용소는 두 개의 계곡이 만나는 지점이다. 왼쪽은 능여암으로 이어지는 능여 계곡이고, 오른쪽은 운수암으로 이어지는 운수 계곡이다. 능여 계곡은 바위투성이에 물살도 거칠다. 반면 운수 계곡은 도톰한 흙살 사이로 자분자분 흐르고 그 소리까지 나긋나긋하다. 여름이라면 또 모를까, 봄에는 새색시 같은 운수 계곡이 제격이다.
용소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운수 계곡 길이다. 한사람 겨우 지날 이 오솔길은 안거 철 선방 스님들이 포행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나 아는 제법 비밀스러운 길이다.
“따르르르~”
숲속 어딘가에서 딱따구리가 참나무 썩은 둥치를 쪼나 보다.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눈길을 돌리다가 산비탈 노루와 눈이 마주쳤다.
저도 놀랐는지, 멀뚱멀뚱 한참을 쳐다보다가 후다닥 달아난다. 그 모양새가 우스워 조용한 숲을 깨울 만큼 소리 내어 웃었다.
걸음의 속도를 더 늦추었다. 빨리 갈 요량이었으면 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이상하다. 걸음을 늦출수록 시선이 자꾸 땅으로 향한다. 터벅터벅 걷고 있는 발걸음을 문득 내려다본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길은 목적지를 전제로 한다. 목적이 길의 가치를 결정한다. 자신이 설정한 목적지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속도와 편리함이 좋은 길을 결정한다. 하지만 돌아보아야 한다. 목적지에만 의미를 둔다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가치를 잃는다.
삶은 긴 여정(旅程)이고, 누군가의 일생(一生)은 곧 그가 걸은 시간이다.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살아가는 방법이 아름다워야 하고, 일생이 행복하려면 살아가는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 그 아름다움과 행복은 편리하고 빠른 길보다 꼬불꼬불하고 느린 길에서 맛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가는 이 드문 오솔길을 선택한 자신이 갑자기 기특하게 여겨졌다. 입꼬리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거두고 고개를 들어보니, 개울 건너가 명적암(明寂庵) 가는 길이다. 그냥 폴짝 뛰어도 될 산개울을 굳이 징검다리를 밟고 천천히 건넜다.
단풍나무와 어우러진 솔밭을 가로지르자 높다란 누각이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서학루(棲鶴樓), 학이 깃들인 누각이라니 그 이름이 멋들어지고 날렵하지만, 전혀 가볍지 않은 글씨체로 쓴 주련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텅 빈 산에 아무도 없지만 空山無人
물은 흐르고 꽃이 피는구나. 水流花開
누각에 오르자 멀리 동쪽으로 금오산이 보인다. 꼭 부처님이 누워 계신 모습 같다고 하여 종종 와불산(臥佛山)이라고도 부른다. 명적암은 영허당(暎虛堂) 녹원(綠園) 대종사께서 주춧돌만 남은 옛터에 중건해 주석하다가 열반하신 암자이다. 스님은 조선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세가 기운 직지사를 오늘의 대찰로 중창하신 분이다. 그 어렵던 시절에 맨주먹으로 대가람을 건설했으니, 서원(誓願)의 힘이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제법 걸은 것 같은데, 몸도 마음도 가뿐하다. 그래서 내친김에 다시 중암(中庵)으로 향했다. 산 내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어 그런지 뺨을 스치는 바람이 싸늘하다. 오르는 길 양쪽으로 활엽수만 그득해 겨울을 보낸 풍경이 스산하다. 혼자서 괜히 투덜거렸다.
“소나무가 울창하면 좀 좋아.”
중암은 관응당(觀應堂) 지안(智眼) 대종사께서 옛터에 중건해 주석하다가 열반하신 암자이다. 스님은 선과 교를 겸비한 산문의 표상이며, 청정한 계행과 고아한 인품으로 학처럼 살다간 어른이셨다. 암자 왼쪽 청룡(靑龍) 봉우리에 큰스님께서 자주 오르내리셨던 팔각 정자가 있다. 그 기둥에 걸린 환성 지안(喚醒志安) 선사의 게송이 눈에 들어온다.
벗이 있어 초가집 찾아오니
밝은 달, 맑은 바람이로다
밝은 달 맑은 바람과 늘 함께했으니, 전혀 외롭지 않으셨겠구나 싶다. 구순을 훌쩍 넘겨 열반하신 스님은 말년에 어떤 심경이셨을까? 나란히 걸린 함월 해원(涵月海源) 선사의 게송이 그 답을 대신하는 듯하다.
한평생 무얼 가졌던가?
벽에 걸린 표주박 하나.

정자 주위를 한참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다. 내려오는 길, 돌아보니 오늘 내가 걸어온 길은 예전부터 있던 길이다. ‘갈림길에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누군가 걸었던 길이다. 이 산에서 1,600년이나 이어진 직지사, 내실이 없고 따라 걸은 이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가능했을까?
목욕탕만 한 못에 무슨 용이냐며 부화(浮華)라 시비하고, 활엽수만 그득해 초라한 숲이라 투정했던 것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다. 문득 누실명(陋室銘)의 첫 문장이 떠올랐다.
산은 높이로 따질 수 없으니
신선이 살면 곧 명산이요,
물은 깊이로 따질 수 없으니
용이 살면 곧 신령한 못이다.
아름드리 활엽수 사이로 난 암자 가는 길, 봄이 무르익으면 이 오솔길에 파스텔 연두색이 가득하고, 개울가에는 색색의 꽃들이 아롱지겠지.

명적암 : 황악산 중턱에 자리한 암자다. 직지사에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 덕분에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알려져 있다. 누각에 서면 탁 트인 절경이 펼쳐진다.

중암 : 황악산의 중심에 위치한 암자로, 명적암에서 도보로 30분 거리다. 14칸 전각 옆에 2000년 새롭게 건립된 영산보전이 있다. 팔각의 누정에 서면 김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황악산 직지사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054-429-1700~4 l http://www.jikjisa.or.kr
■ 출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매거진(vol.65)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