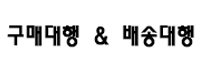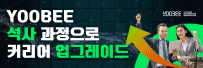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뉴질랜드 설맞이
낯선 나라에 이주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은 새로운 문화와 부딪히게 되고 문화적인 충격을 겪게도 된다. 이러한 문화적인 충격을 흡수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용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수 천 년 이어져 내려온 민족 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현지 사회의 문화와 동화해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뉴질랜드에서의 사회적 통념은 차이(Difference)는 인정하되 차별(Discrimination)하지는 않는다는 의식이다. 현대사회의 추세가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5대양 6대주로부터 각각의 인종과 민족 그룹들이 이주해 와서 형성한 신생 국가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며 다른 것들을 차별로 대한다면 공동체의 평화 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 1일에는 오클랜드 시내 Ellen Melville Centre에서 음력 새해를 축하하는 축제가 중국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 공동으로 열렸다. ‘음력 새해’는 이 나라에서 흔히 ‘Chinese Lunar New Year’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날’을 축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은 불편한 심기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오래전부터 시내 앨버트 파크(Albert Park)에서 대대적인 음력 새해 축제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키위들은 ‘Lunar New Year’를 ‘Chinese New Year’로 알고 있다. 추석 명절도 그렇다. 중국 커뮤니티에서 ‘Moon Festival’ 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실내외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한국의 ‘추석’은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런 행사에 프로그램으로나마 참여를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설날은 신라시대 서기 488년부터 시작된 기록이 있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로 이어져 내려 왔다. 조선시대 말기 을미개혁으로 양력이 도입되면서 1896년부터 공식적인 새해 첫날의 기능은 양력 1월1일로 변경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도 양력1월1일은 신정(新正), 우리의 전통 설날인 음력1월1일은 구정(舊正)으로 불리어져왔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음력설은 이중과세(二重過歲) 방지라는 명분으로 푸대접을 받아 왔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휴일도 아닌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고 전통의식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1985년에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1989년에는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을 받아 들여 음력설을 설날로 지정하고 음력 12월 말일부터 1월2일 까지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에 오클랜드 중앙 도서관에서는 음력 새해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Year of Dragon–New Year Traditions’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중국과 한국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새해를 기념하는지에 대한 상호 문화 이해의 장으로 펼쳐진 것이다. 이 때 중국 측 강사 Helen Wong 과 한국 측 한일수가 발표를 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 때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적 배경, 한국의 역사적 배경, 신정/구정의 변화 배경, 흑룡이 한국 사회에서 상징하는 내용, 설날 세시 풍속 소개 등으로 진행했다. 한민족은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서 음력 새해 첫날은 ‘설날’로 한민족의 고유한 명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까치까치 설날’ 노래를 같이 참가한 한인들과 함께 불러 주었으며 ‘제기차기’등 민속놀이를 설명하고 제기차기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교육원에서는 프라이머리, 인터미디어트,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기 중 희망 학교를 선정하여 한 번에 두 클래스 씩 전통문화 팀 선생님들이 방문하여 클래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복, 한글서예, 국궁, 투호, 제기차기, 징 치기 등 학생들을 몇몇 그룹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체험을 해보는 시간인데 학생들은 매우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다. 강의로 듣기만 하는 수업보다는 체험학습이 재미있을뿐더러 교육 효과도 탁월하게 나타나게 되는 법이다. 대부분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해온 학생들이라 한글과 간단한 한국어 의사표현은 할 줄 아는 학생들이다. 이런 체험 학습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이 널리 전파될수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국/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한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번 음력 새해 축제도 한국교육원 주관으로 한국 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참여하여 즐기는 모습이었다. 사물놀이, 부채춤, 가야금, 태권도 등 공연이 있었고 각종 음식 부스와 함께 한복, 한국 다도, 전통혼례, 한글 서예, 국악 등 전시 코너에서는 실제로 체험도 할 수 있어 특히 어린 자녀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아쉬웠던 점은 공간의 협소로 여러 세시풍속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과 한인 커뮤니티 주도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면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은 준비도 간단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시풍속이다. 게임 요소도 있어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도 한다. 영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힛트 할 수 있었던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정착되리라고 예상된다. 문화란 짧은 시간에 학습되는 것도 아니며 기계화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생활 관습이나 관념을 통해 축적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전되어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가고 있으며 첨단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은 동시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있다. 끝없는 물질문명의 횡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전례가 없는 자연재난 발생 등으로 지구촌 인류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나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전 인류가 공동으로 협력해나가야 할 일이다. 물질 지상주의의 망령을 버리고 활발한 문화 공유를 통해서 인류 화평(和平)의 시대를 전개해나가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에서 각 민족들의 전통문화가 공유되어 새로운 문화 융합의 시대를 창조해내는 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