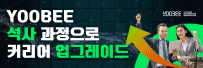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모투나우 해변 → 크라이스처치(Ⅰ)
0 개
1,783
23/06/2010. 15:43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 여행
부스럭 소리에 잠에서 깨니 부실한 저녁 식사 때문에 배고픈 봉주 형님이 손수 쌀을 씻고 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이웃 캐러밴의 노부부가 빨래하느라 바쁘다. 대부분의 키위 캠퍼족들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유료 빨래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빨래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모처럼 이불과 축축한 신발 밑창을 꺼내 널었다. 수염이 멋지게 난 옆집 할아버지가 눈인사를 한다. 서로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가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다 그들의 캐러밴에 초대를 받았다.
봉주 형님이 한 밥은 뚜껑을 밀고 올라왔다. 물을 붓고 몇 번을 뒤집어준 후에야 겨우 밥 비슷한 것이 됐다. 밥을 서둘러 먹고 창 밖을 보니 옆집 주인장이 아직도 실내를 청소하는 듯하다. 조금 후에 캐러밴 앞의 작은 카펫을 다시 까는 모습을 보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이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책과 같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한 페이지만 읽는 셈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유연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친해지기도 쉽다. 이웃 캐러밴의 로빈 씨 부부는 4주째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캠퍼족인 로빈 씨 같은 사람이 뉴질랜드 전체에 6만 명 정도 있다. 대개 물을 싫어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요트 대신 캠퍼밴을 타고 다니거나 지프차에 캐러밴을 달고 다니는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현실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화를 배우며 삶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을 큰 재미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따뜻한 미소의 로빈 씨 가족은 마치 어릴 때 만났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했다. 방명록에 새겨진 고운 십자수에는 비둘기와 함께 에스프리투 산토(Espritu Santo)라고 적혀 있다.
에스프리투 산토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국가의 가장 큰섬이자 성경에 나오는 성령(Holy Spirit)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방명록 표지에 이렇게 수놓은 이유를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로빈씨의 표정이 밝아진다.
“에스프리투 산토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섬이었죠. 젊은 시절 방황을 거듭하다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작은 섬나라에 가서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곳이 바로 바누아투의 에스프리투 산토예요. 그곳에서 난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어요. 처음 그 여인을 봤을 때 뭔가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력을 받았고 숨이 찰 정도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 뒤에 우리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결국 평생의 배우자로 만나 함께 살고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해봤겠지만, 우리가 감동하는 건 처음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오랜 시간(50년이 다 되도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로빈 씨 부부의 마음이었다. 세월과 함께 더 깊어가는 아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러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주 형님이 한 밥은 뚜껑을 밀고 올라왔다. 물을 붓고 몇 번을 뒤집어준 후에야 겨우 밥 비슷한 것이 됐다. 밥을 서둘러 먹고 창 밖을 보니 옆집 주인장이 아직도 실내를 청소하는 듯하다. 조금 후에 캐러밴 앞의 작은 카펫을 다시 까는 모습을 보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이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책과 같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한 페이지만 읽는 셈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이 유연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친해지기도 쉽다. 이웃 캐러밴의 로빈 씨 부부는 4주째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캠퍼족인 로빈 씨 같은 사람이 뉴질랜드 전체에 6만 명 정도 있다. 대개 물을 싫어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요트 대신 캠퍼밴을 타고 다니거나 지프차에 캐러밴을 달고 다니는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현실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화를 배우며 삶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을 큰 재미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따뜻한 미소의 로빈 씨 가족은 마치 어릴 때 만났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했다. 방명록에 새겨진 고운 십자수에는 비둘기와 함께 에스프리투 산토(Espritu Santo)라고 적혀 있다.
에스프리투 산토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국가의 가장 큰섬이자 성경에 나오는 성령(Holy Spirit)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방명록 표지에 이렇게 수놓은 이유를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로빈씨의 표정이 밝아진다.
“에스프리투 산토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섬이었죠. 젊은 시절 방황을 거듭하다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작은 섬나라에 가서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곳이 바로 바누아투의 에스프리투 산토예요. 그곳에서 난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어요. 처음 그 여인을 봤을 때 뭔가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력을 받았고 숨이 찰 정도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 뒤에 우리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결국 평생의 배우자로 만나 함께 살고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해봤겠지만, 우리가 감동하는 건 처음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오랜 시간(50년이 다 되도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로빈 씨 부부의 마음이었다. 세월과 함께 더 깊어가는 아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러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