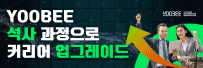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우리는...
7 개
4,366
23/08/2011. 12:24
NZ코리아포스트
왕하지의 볼멘소리
요즘은 하루세끼 밥 먹듯 하루에 서 너 번씩 비가 내리니 빨래를 벽난로 옆에다 널어두는데 어머니는 빨래를 빨리 개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랑날랑하시며 빨래를 만져보신다. 젖은 빨래는 절대 개지 말라고 아내가 말해도 소용없다. 빨래를 개서 거실에 그냥 두기만 해도 다행인데 애들 방까지 배달까지 해주시니 아내가 바뀐 빨래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며 부리는 신경질은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날아온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즐겨 입던 군청색 팬티 2장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아들도 안 입었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 나타났는지 몇 주 만에 무사히 돌아오긴 했다.
오늘도 어머니가 빨래를 개어서 애들 방에 배달을 하고 안방에도 배달을 하시려기에 그냥 소파 위에다 놓으시라고 말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건 우리거야~”
우리 거? 즉, 아들내외 거라는 말씀이시다. 내가 들어도 이상한데 아내가 들으면 어떻겠는가, ‘아니, 그럼 애들은 남이란 말예요~’ 하고 또 한마디 들으실 게 뻔하다.
한 치 걸러 두 치라는 말이 있다. 촌수가 멀어질수록 사이가 벌어진다는 말이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1촌이고 손자는 2촌이지만 나에게는 어머니도 1촌 자식도 1촌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손녀딸네 식구만 아직 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뜨끔했다.
“아니? 손녀딸네 식구가 뭐에요~ 다 같은 우리식구지요~” 아내가 목소리가 커지자 내가 보충설명을 해야 했다.
“아, ‘손녀딸하고 증손자하고 안 왔다.’라는 말이 너무 길어서 간략기법을 쓰신 거지 뭐,”
“하여간, 어머니야 말로 큰아들에게 재산 다주고 했으니 큰집식구지 어디 우리식구야? 전에는 손녀딸 때문에 우리 둘째아들 뉴질랜드로 뺏겼다고 그렇게 손녀딸을 원망하시더니~”
아내는 또 나한테 짜증을 부렸다. 내가 뭘 어쨌다고...
주방에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밥 먹을 준비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딸은 저녁밥을 안 먹는다고 하고 아들은 시내서 먹고 왔다고 했다.
“진작 좀 얘기해주지. 밥 괜히 했네, 아빠랑 나는 찬밥 먹어도 되는데... 계란찜도 괜히 했잖아, 우리는 그냥 김치랑 먹어도 되는데...”
무심코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옆에 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애들 입은 입이고 남편 입은 주둥이란 말인가, 아무거나 집어 넣어도 되는...
기왕 해 놓은 계란찜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따뜻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애들이 없다면 그대와 함께 찬밥을 자주 즐겼겠지, ‘그대와 함께 찬밥을,’ 무슨 댄스 주제곡 같고 만...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오 바로 이 순간~)
가수 송창식씨가 부른 ‘우리는’이라는 노래는 가사 좋고 곡 좋고 우리가 부르기 딱 좋은 우리의 노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사 내용이 맞지 않아 이렇게 바꿔 부르면 딱 맞을 듯싶다.
(우리는~ 우리는~ 찬밥만 있으면 김치랑 먹을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젓가락 하나로 한 끼 때울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찬밥만 먹었다~ 생명처럼 소중한 김치와 함께 지냈다~ 오오 바로 이 김치~) 제길,
“아저씨~ 여기 우리도 있어요.”
부채꼬리새 한 쌍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한 마리는 열심히 부채춤을 추고 있었다. 아마 남편 새가 심심해 할까봐 아내 새가 부채춤을 추고 있나보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가 즐겨 입던 군청색 팬티 2장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아들도 안 입었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 나타났는지 몇 주 만에 무사히 돌아오긴 했다.
오늘도 어머니가 빨래를 개어서 애들 방에 배달을 하고 안방에도 배달을 하시려기에 그냥 소파 위에다 놓으시라고 말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건 우리거야~”
우리 거? 즉, 아들내외 거라는 말씀이시다. 내가 들어도 이상한데 아내가 들으면 어떻겠는가, ‘아니, 그럼 애들은 남이란 말예요~’ 하고 또 한마디 들으실 게 뻔하다.
한 치 걸러 두 치라는 말이 있다. 촌수가 멀어질수록 사이가 벌어진다는 말이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1촌이고 손자는 2촌이지만 나에게는 어머니도 1촌 자식도 1촌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손녀딸네 식구만 아직 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뜨끔했다.
“아니? 손녀딸네 식구가 뭐에요~ 다 같은 우리식구지요~” 아내가 목소리가 커지자 내가 보충설명을 해야 했다.
“아, ‘손녀딸하고 증손자하고 안 왔다.’라는 말이 너무 길어서 간략기법을 쓰신 거지 뭐,”
“하여간, 어머니야 말로 큰아들에게 재산 다주고 했으니 큰집식구지 어디 우리식구야? 전에는 손녀딸 때문에 우리 둘째아들 뉴질랜드로 뺏겼다고 그렇게 손녀딸을 원망하시더니~”
아내는 또 나한테 짜증을 부렸다. 내가 뭘 어쨌다고...
주방에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밥 먹을 준비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딸은 저녁밥을 안 먹는다고 하고 아들은 시내서 먹고 왔다고 했다.
“진작 좀 얘기해주지. 밥 괜히 했네, 아빠랑 나는 찬밥 먹어도 되는데... 계란찜도 괜히 했잖아, 우리는 그냥 김치랑 먹어도 되는데...”
무심코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옆에 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애들 입은 입이고 남편 입은 주둥이란 말인가, 아무거나 집어 넣어도 되는...
기왕 해 놓은 계란찜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따뜻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애들이 없다면 그대와 함께 찬밥을 자주 즐겼겠지, ‘그대와 함께 찬밥을,’ 무슨 댄스 주제곡 같고 만...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오 바로 이 순간~)
가수 송창식씨가 부른 ‘우리는’이라는 노래는 가사 좋고 곡 좋고 우리가 부르기 딱 좋은 우리의 노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사 내용이 맞지 않아 이렇게 바꿔 부르면 딱 맞을 듯싶다.
(우리는~ 우리는~ 찬밥만 있으면 김치랑 먹을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젓가락 하나로 한 끼 때울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찬밥만 먹었다~ 생명처럼 소중한 김치와 함께 지냈다~ 오오 바로 이 김치~) 제길,
“아저씨~ 여기 우리도 있어요.”
부채꼬리새 한 쌍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한 마리는 열심히 부채춤을 추고 있었다. 아마 남편 새가 심심해 할까봐 아내 새가 부채춤을 추고 있나보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s 203.♡.31.24
왠지 노래 가사가 마음에와닿네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글보고 있습니다
혼자 많이 웃었네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글보고 있습니다
혼자 많이 웃었네요
Like
우리는 ~~~ 행복해 124.♡.54.14
노래 가사 끝부분에
우리는 ~~ 행복해~~~로
가사를 마무리 하시면
왕하지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되십니다
ㅎㅎㅎ
또한번 웃으며 지나갑니다
행복하세요
가장 소중한 (??) 자녀분들과...
우리는 ~~ 행복해~~~로
가사를 마무리 하시면
왕하지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되십니다
ㅎㅎㅎ
또한번 웃으며 지나갑니다
행복하세요
가장 소중한 (??) 자녀분들과...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