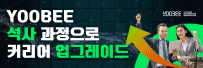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엄마의 향기
4 개
5,268
27/09/2011. 11:11
NZ코리아포스트
왕하지의 볼멘소리
얼마 전, 손자 샘이 아빠 집에 갔다가 하루 일찍 돌아왔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다며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볼에다 연신 뽀뽀를 해댔다. 옆에서 아내가 “할미도 보고 싶었어?”라고 묻자 손자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오르지 엄마만 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런 고얀 놈, 9살이 될 때까지 엄마랑 보낸 시간보다 할미랑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할미는 안중에도 없다. 할미가 매일 학교에 픽업 해주지, 맛있는 거만 골라 다주지, 밤에 재워주지, 그렇게 키웠는데도 엄마 밖에 모른다.
그것은 엄마의 향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도 엄마의 향기만 맡으면 눈물을 멈추고 개구쟁이도 엄마의 향기만 맡으면 갑자기 온순해지고 행복해진다.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이는 엄마의 향기를 느끼며 그리워한다. 엄마의 향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아이의 곁으로 날아다니며 아이만이 엄마의 그 특별한 향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손자가 아빠 집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다.
“하지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내가 묻자 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엄마, 할미, 하지, 삼촌 다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우리손자가 식구들 다 보고 싶어서 일찍 왔대, 아이고 기특해라~”
손자는 집에 오자마자 찬장에서 제일 큰 접시를 꺼내들고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두 공기나 되는 밥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9살이 되니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많이 착해졌다. 집에 전화가 오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전화를 받느라고 내가 진땀을 흘릴 때가 많은데 요즘은 손자가 잽싸게 달려가 두개의 언어로 전화를 받는다.
“헬로~ 여보세요~”
덩치도 얼마나 컸는지 할아버지 잠옷도 입을 수 있고 얼마 전에는 할미 바지 기장을 줄여 주었더니 잘 입고 다닌다. 엄마 바지는 통이 작어서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제 좀 있으면 할아버지 바지를 다 빼앗아 입게 생겼다.
몇 년 전인가 토끼 굴을 소가 밟아 새끼들이 다 죽고 한 마리만 살아있어 키운 적이 있었다. 눈도 안 뜬 쥐만 한 토끼새끼를 작은 수저로 우유를 먹이며 키웠는데 내 발바닥에서 잠자기를 좋아했고 밖에서 놀다가 용케도 내 발 냄새를 맡으며 잘 찾아왔다. 며칠 지나 눈을 뜬 후 풀밭에 내 놓으면 풀도 뜯어먹고 꽃도 뜯어먹고 뛰어 놀다가 내 발등에 와서 앉아 있곤 하였다. 새끼토끼는 내 발 냄새를 엄마의 향기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매를 키웠다. 동네 형이 깊숙한 산속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매 둥지를 발견하고 새끼를 꺼내와 동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는 집으로 달려갔고 매는 큰소리로 울어대며 나를 반겨주었다. 내가 개구리를 잡아 던져주면 발로 낚아채어 날카로운 부리로 맛있게 뜯어 먹었다.
우리 집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나는 매를 멀리 날려 보냈는데 그 후 시골에 갔을 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외삼촌이 제발 매 좀 데리고 가라고 사정하였다. 매가 매일 밤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때문에 벽이 온통 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매는 똥을 쌀 때 위로 쏘는데 똥이 몇 미터씩 날아가기 때문이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메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다. 마루 밑에서 새끼를 낳아 내가 개집으로 옮겨주었는데 어미가 3일 후에 차에 치어 죽고 말았다. 그 때 이웃 아줌마가 새끼를 낳은 후 옮겨주면 3일후에 어미가 죽는다면서 자기 집 개도 그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눈도 안 뜬 새끼는 키우기가 힘드니 한 마리를 키워준다고 달라고 하였다. 나는 내가 다 키우겠다고 주지 않았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방학이라 밤낮으로 우유를 먹이면서 키울 수가 있었다.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해도 새끼들 우유 먹이며 돌봐야하기 때문에 놀러가지 못했고 친구들은 나를 개 엄마라고 불렀다.
내가 가는 곳마다 5남매는 졸랑졸랑 따라다녔다. 화장실에 가면 5남매는 재래식화장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곤 하였다. 무더운 여름에 한 이불속에서 5남매랑 같이 살았으니 방안이 완전 개판에다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그땐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다. 새끼들이 다 자라 강아지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한 마리만 남기고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엄마 곁을 떠나기 싫어 깨갱거리는 새끼들이 떠날 때마다 내 눈에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내렸다. 아, 내가 어떻게 키운 개새끼들인데...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런 고얀 놈, 9살이 될 때까지 엄마랑 보낸 시간보다 할미랑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할미는 안중에도 없다. 할미가 매일 학교에 픽업 해주지, 맛있는 거만 골라 다주지, 밤에 재워주지, 그렇게 키웠는데도 엄마 밖에 모른다.
그것은 엄마의 향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도 엄마의 향기만 맡으면 눈물을 멈추고 개구쟁이도 엄마의 향기만 맡으면 갑자기 온순해지고 행복해진다.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이는 엄마의 향기를 느끼며 그리워한다. 엄마의 향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아이의 곁으로 날아다니며 아이만이 엄마의 그 특별한 향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손자가 아빠 집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다.
“하지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내가 묻자 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엄마, 할미, 하지, 삼촌 다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우리손자가 식구들 다 보고 싶어서 일찍 왔대, 아이고 기특해라~”
손자는 집에 오자마자 찬장에서 제일 큰 접시를 꺼내들고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두 공기나 되는 밥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9살이 되니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많이 착해졌다. 집에 전화가 오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전화를 받느라고 내가 진땀을 흘릴 때가 많은데 요즘은 손자가 잽싸게 달려가 두개의 언어로 전화를 받는다.
“헬로~ 여보세요~”
덩치도 얼마나 컸는지 할아버지 잠옷도 입을 수 있고 얼마 전에는 할미 바지 기장을 줄여 주었더니 잘 입고 다닌다. 엄마 바지는 통이 작어서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제 좀 있으면 할아버지 바지를 다 빼앗아 입게 생겼다.
몇 년 전인가 토끼 굴을 소가 밟아 새끼들이 다 죽고 한 마리만 살아있어 키운 적이 있었다. 눈도 안 뜬 쥐만 한 토끼새끼를 작은 수저로 우유를 먹이며 키웠는데 내 발바닥에서 잠자기를 좋아했고 밖에서 놀다가 용케도 내 발 냄새를 맡으며 잘 찾아왔다. 며칠 지나 눈을 뜬 후 풀밭에 내 놓으면 풀도 뜯어먹고 꽃도 뜯어먹고 뛰어 놀다가 내 발등에 와서 앉아 있곤 하였다. 새끼토끼는 내 발 냄새를 엄마의 향기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매를 키웠다. 동네 형이 깊숙한 산속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매 둥지를 발견하고 새끼를 꺼내와 동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는 집으로 달려갔고 매는 큰소리로 울어대며 나를 반겨주었다. 내가 개구리를 잡아 던져주면 발로 낚아채어 날카로운 부리로 맛있게 뜯어 먹었다.
우리 집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나는 매를 멀리 날려 보냈는데 그 후 시골에 갔을 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외삼촌이 제발 매 좀 데리고 가라고 사정하였다. 매가 매일 밤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때문에 벽이 온통 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매는 똥을 쌀 때 위로 쏘는데 똥이 몇 미터씩 날아가기 때문이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메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다. 마루 밑에서 새끼를 낳아 내가 개집으로 옮겨주었는데 어미가 3일 후에 차에 치어 죽고 말았다. 그 때 이웃 아줌마가 새끼를 낳은 후 옮겨주면 3일후에 어미가 죽는다면서 자기 집 개도 그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눈도 안 뜬 새끼는 키우기가 힘드니 한 마리를 키워준다고 달라고 하였다. 나는 내가 다 키우겠다고 주지 않았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방학이라 밤낮으로 우유를 먹이면서 키울 수가 있었다.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해도 새끼들 우유 먹이며 돌봐야하기 때문에 놀러가지 못했고 친구들은 나를 개 엄마라고 불렀다.
내가 가는 곳마다 5남매는 졸랑졸랑 따라다녔다. 화장실에 가면 5남매는 재래식화장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곤 하였다. 무더운 여름에 한 이불속에서 5남매랑 같이 살았으니 방안이 완전 개판에다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그땐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다. 새끼들이 다 자라 강아지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한 마리만 남기고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엄마 곁을 떠나기 싫어 깨갱거리는 새끼들이 떠날 때마다 내 눈에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내렸다. 아, 내가 어떻게 키운 개새끼들인데...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나 121.♡.199.236
하지님 발에서 잠든 토끼 모습이 평화스럽고 사랑스럽고, 참 아늑해보이네요. 토끼를 위해 기꺼이 발침대를 제공하시고 엄마가 되어주신 하지님 사랑 때문이겠지요.
참고로 저도 중학교 시절 별명이 '개엄마'였답니다. 야쿠르트병에 우유를 넣어 강아지들에게 먹이곤 했는데, 젖이 모자라 배가 등가죽에 붙어 있던 강아지 배가 볼록 일어나는 것이 기뻤답니다.
참고로 저도 중학교 시절 별명이 '개엄마'였답니다. 야쿠르트병에 우유를 넣어 강아지들에게 먹이곤 했는데, 젖이 모자라 배가 등가죽에 붙어 있던 강아지 배가 볼록 일어나는 것이 기뻤답니다.
Like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