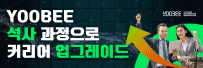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327] 캔노인과 인삼차
0 개
3,216
27/02/2006. 15:53
KoreaTimes
자유기고
휘휘익~ 가느다랗게 금속성으로 울리는 휘파람을 불며 뒷걸음으로 집에서 나오는 캔 노인, 그리고 짤랑짤랑 방울소리를 내며 종종걸음으로 따라 나오는 회색 고양이. 언제부터 그 집 가족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지음 한 쌍의 콤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풍경이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밝고 명랑하게 열리고 있다. 혈색 좋고 건강한 얼굴이며 탱탱하게 야물어 보이는 몸매까지 머리에서도 고령의 노인다운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할아버지가 인삼차 덕분에 더욱 좋아지고 있나? 싱거운 생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흉내내듯 내 아침도 신선하고 상큼하게 열어 가게 된다. 힘에 겨워 낑낑대며 들고 나가는 내 골프가방도 가볍게 번쩍 들어 잘도 내다 주는 파워 맨. 그는 친절하기도 또한 남다르다.
문득 무언가를 잊은 사람처럼 기억을 더듬는 나(지난 번 그 때가 언제였지?) 게으름을 떨다보니 벌써 세월이 많이도 흘러갔음을 알고 소스라쳐 놀란다. 손가락을 꼽아 헤어 보며 인삼차 사는 걸 머리 속에 꼭꼭 다진다.
여기와서 얼마쯤 지났을 때다. 어느 날 찬장 속에서 묵히고 있는 인삼차가 보이길래 이 십여개 정도를 손에 모아 쥐고 궁리를 했다. 무언가를 늘상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절한 캔노인. 그러나 막상 무얼 준비한다는 게 늘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니 더더욱 그 일은 마음 뿐으로 미루고 사는 숙제처럼 찜찜했다. 홍차에 우유를 섞어 마시는 멀건 티가 내 입맛에 맞지 않듯 그들도 이걸 좋아하려나? 작은 화장품 케이스에 차곡차곡 담고 정성스럽게 겉포장을 해서 들고 갔다. 맥 빠지게 자신없는 일로 불안할 때 같이 엉거주춤 노크를 하니 베티가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 준다.
“이것은 코리아의 그 유명한 ‘진생 티'인데 진생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역시 눈이 동그래져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안을 향해 남편 캔을 불러냈다.(그러면 그렇지…) 어깨가 쳐지려는 찰나에 그가 진생? 하면서 눈이 반짝 빛나더니 두 팔을 힘차게 휘두르며“파워 파워”하며 엄지손가락을 세우는게 아닌가.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한결같이 파워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에 웃음이 나와서 “오케이 굿 파워”하며 맞장구를 쳐줬다.
그는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두 손으로 받쳐들고 댕큐 베르마치를 연발하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따끈한 꿀물에 타서 마시라고 가르켜주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 속에 자랑이라는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내가 마치 애국자가 된 듯한 치기까지…, 인삼을 알고 있는 그가 갑자기 유식해 보이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주일쯤 지났을까? 지난번 그 케이스를 들고 와 살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 그 케이스는 화장품 케이스였기에 나는 속에서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하마터면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를 뻔 했다.
내가 쏜 화살이 그들 마음속 과녁을 명중했다는 기쁨이 터진 봇물처럼 내 전부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인삼차를 사랑하는 영국 할아버지 캔노인.
그는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5짜리 두 장을 불쑥 내밀었다. “No thank you”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돈을 받다니…, 그가 보통 때 자신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쭈뼛거리며 부탁하는 모습도 기득권자의 우월감을 부추겨 주는 것같아 좋았다. 영어도 안되는 코리안이 이들 속에 섞여서 늘상 쫄며 살던 내가 아닌가.
며칠 후 원래의 케이스에 담긴 인삼차를 구입해서 갖다 주는 걸로 시작해서 나는 한국식품점에 인삼차 단골이 되고 우리의 이웃정은 그렇게 도타워져만 간다. 그래서일까 그는 더 늙는게 아니고 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나만보면 엄지 손가락을 추켜 세우고“파워 오케이” 하며 함빡 웃을 땐 내가 더 신이 나고 행복한 웃음이 나온다.
그는 오늘도 예쁘게 가꾼 가든의 꽃들과 소곤거리며 꿈을 쫓는 눈빛으로 젊은이들보다 더 분주하다. 나는 매일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인삼차 효능에 푹 빠져 마음의 건강을 지켜간다.
참, 이제부터 외출시에는 잊지말고 향수를 써야지. 지난 크리스마스때 내게 선물해준 ‘알레싸 에쉴리'가 있었지. 그들의 다정한 체취인양 오래오래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드린다.
정갈하고 예쁘게 사시는 두 분의 건강이 늘 오늘같아 잔잔한 행복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가정되게 하소서.
문득 무언가를 잊은 사람처럼 기억을 더듬는 나(지난 번 그 때가 언제였지?) 게으름을 떨다보니 벌써 세월이 많이도 흘러갔음을 알고 소스라쳐 놀란다. 손가락을 꼽아 헤어 보며 인삼차 사는 걸 머리 속에 꼭꼭 다진다.
여기와서 얼마쯤 지났을 때다. 어느 날 찬장 속에서 묵히고 있는 인삼차가 보이길래 이 십여개 정도를 손에 모아 쥐고 궁리를 했다. 무언가를 늘상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절한 캔노인. 그러나 막상 무얼 준비한다는 게 늘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니 더더욱 그 일은 마음 뿐으로 미루고 사는 숙제처럼 찜찜했다. 홍차에 우유를 섞어 마시는 멀건 티가 내 입맛에 맞지 않듯 그들도 이걸 좋아하려나? 작은 화장품 케이스에 차곡차곡 담고 정성스럽게 겉포장을 해서 들고 갔다. 맥 빠지게 자신없는 일로 불안할 때 같이 엉거주춤 노크를 하니 베티가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 준다.
“이것은 코리아의 그 유명한 ‘진생 티'인데 진생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역시 눈이 동그래져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안을 향해 남편 캔을 불러냈다.(그러면 그렇지…) 어깨가 쳐지려는 찰나에 그가 진생? 하면서 눈이 반짝 빛나더니 두 팔을 힘차게 휘두르며“파워 파워”하며 엄지손가락을 세우는게 아닌가.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한결같이 파워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에 웃음이 나와서 “오케이 굿 파워”하며 맞장구를 쳐줬다.
그는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두 손으로 받쳐들고 댕큐 베르마치를 연발하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따끈한 꿀물에 타서 마시라고 가르켜주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 속에 자랑이라는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내가 마치 애국자가 된 듯한 치기까지…, 인삼을 알고 있는 그가 갑자기 유식해 보이고 존경스럽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주일쯤 지났을까? 지난번 그 케이스를 들고 와 살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 그 케이스는 화장품 케이스였기에 나는 속에서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하마터면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를 뻔 했다.
내가 쏜 화살이 그들 마음속 과녁을 명중했다는 기쁨이 터진 봇물처럼 내 전부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인삼차를 사랑하는 영국 할아버지 캔노인.
그는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5짜리 두 장을 불쑥 내밀었다. “No thank you”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돈을 받다니…, 그가 보통 때 자신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쭈뼛거리며 부탁하는 모습도 기득권자의 우월감을 부추겨 주는 것같아 좋았다. 영어도 안되는 코리안이 이들 속에 섞여서 늘상 쫄며 살던 내가 아닌가.
며칠 후 원래의 케이스에 담긴 인삼차를 구입해서 갖다 주는 걸로 시작해서 나는 한국식품점에 인삼차 단골이 되고 우리의 이웃정은 그렇게 도타워져만 간다. 그래서일까 그는 더 늙는게 아니고 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나만보면 엄지 손가락을 추켜 세우고“파워 오케이” 하며 함빡 웃을 땐 내가 더 신이 나고 행복한 웃음이 나온다.
그는 오늘도 예쁘게 가꾼 가든의 꽃들과 소곤거리며 꿈을 쫓는 눈빛으로 젊은이들보다 더 분주하다. 나는 매일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인삼차 효능에 푹 빠져 마음의 건강을 지켜간다.
참, 이제부터 외출시에는 잊지말고 향수를 써야지. 지난 크리스마스때 내게 선물해준 ‘알레싸 에쉴리'가 있었지. 그들의 다정한 체취인양 오래오래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드린다.
정갈하고 예쁘게 사시는 두 분의 건강이 늘 오늘같아 잔잔한 행복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가정되게 하소서.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