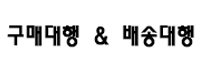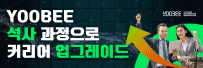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무소유의 법정스님!
1 개
4,242
24/03/2010. 11:49
NZ코리아포스트
풍경소리
무소유의 저자 법정스님께서 입적(入寂)에 드셨다. 입적이라는 말은 '적멸(寂滅)의 경지에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입적(入寂), 원적(圓寂)이라고도 하며, 열반의 동의어로 쓰인다.
원래의 의미로는 죽음이 아니고, 고통과 번뇌의 세계를 떠나 고요한 적정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는 말이다.
좀 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원적에 드셨다'라는 말이 실감 난다. 원적이란 본래 왔던 자리로 되돌아 간다는 뜻이다. 그 왔던 자리가 어디인가?
약산 유엄(藥山 惟儼 745-828)선사는 "운재청천수재병(雲 在靑天水在甁)"이라고 했다.
그 뜻은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이 병에 있다."라는 의미이다.
원적에 관한 깊은 뜻은 다음에 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무소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무소유(無所有)란 '있는 바 없다'라는 뜻이다. 소유하되 집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그 무엇을 가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하되 그것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내 것인데 어찌하여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되 그 것에 얽매이고 구속되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 스스로 고통 속에 갇히게 되어 불행하게 되니 근본을 살펴 나누고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무소유의 근본 뜻은 본래 내 것이란 없는 법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진시황이나 양귀비가 그 많던 부와 명예가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육신마저도 땅은 사후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해 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고 소유하되 소유함 없이 소유하라는 진리 아닌가? 그럴 때는 바다와 같이 한 없이 소유해도 넘치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염 되지도 않고 세상을 이익 되게 맑고 향기롭게 하는 큰 그릇이 된다는 뜻 아닌가?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직역하면 "응당히 머무는 봐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의역하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집착 없이 마음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법정스님께서는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까지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 번뇌를 사지 말라는 뜻이다. 좋은 게 영원하다면 인간이 오만해 지고, 나쁜 게 영원하다면 현재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을 것이니 좋고 나쁜 것도 (유, 무) 역시 한때이므로 현재 상황의 좋고 나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무소유에 어긋나는 이치이다.
물질적인 무소유도 그렇지만 마음의 무소유도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이 내 것인가?
촛불의 불꽃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다.
0.1초 전 틀리고 지금도 틀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도 틀리다. 즉 실체가 없다.
나의 마음도 역시 촛불과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도 매 순간 똑같은가? 모든 흘러가는 것(무상)에는 소유가 없다.
이렇게 내 것이라고 느끼는 내 마음 역시 본래는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존재 비존재이다.
마음의 생각을 아상(我想)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실체를 모르고 상대를 따라 생각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도둑 마음이라고 한다.
착한일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래야만 천국, 극락 간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아상을 떨쳐 버리지 못한 도둑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선행일까? 본래의 마음 무아(無我)를 깨닫는 것이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부처라고 느끼면 만 가지 선행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또한 무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선행은 업장을 단번에 녹일 수 없지만, 무아를 깨닫고 느껴 버리면 그 자체로서 수천 겁 생의 업장을 한순간 녹여 버릴 수 있다.
그렇기에 무소유의 본래 참된 의미는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된다는 마음도 본래 없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른 남녘 산천에 꽃을 피워 놓고, 무소유를 실천 하려고 봄에 수의도, 관도, 명정도 만장도 음식도 꽃도 조사도 영결식도 조의금도 사라도 없이 그렇게 가셨나 보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래의 의미로는 죽음이 아니고, 고통과 번뇌의 세계를 떠나 고요한 적정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는 말이다.
좀 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원적에 드셨다'라는 말이 실감 난다. 원적이란 본래 왔던 자리로 되돌아 간다는 뜻이다. 그 왔던 자리가 어디인가?
약산 유엄(藥山 惟儼 745-828)선사는 "운재청천수재병(雲 在靑天水在甁)"이라고 했다.
그 뜻은 "구름은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이 병에 있다."라는 의미이다.
원적에 관한 깊은 뜻은 다음에 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무소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무소유(無所有)란 '있는 바 없다'라는 뜻이다. 소유하되 집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그 무엇을 가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하되 그것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내 것인데 어찌하여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되 그 것에 얽매이고 구속되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 스스로 고통 속에 갇히게 되어 불행하게 되니 근본을 살펴 나누고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무소유의 근본 뜻은 본래 내 것이란 없는 법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진시황이나 양귀비가 그 많던 부와 명예가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육신마저도 땅은 사후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해 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고 소유하되 소유함 없이 소유하라는 진리 아닌가? 그럴 때는 바다와 같이 한 없이 소유해도 넘치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염 되지도 않고 세상을 이익 되게 맑고 향기롭게 하는 큰 그릇이 된다는 뜻 아닌가?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직역하면 "응당히 머무는 봐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의역하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집착 없이 마음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법정스님께서는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까지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 번뇌를 사지 말라는 뜻이다. 좋은 게 영원하다면 인간이 오만해 지고, 나쁜 게 영원하다면 현재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을 것이니 좋고 나쁜 것도 (유, 무) 역시 한때이므로 현재 상황의 좋고 나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무소유에 어긋나는 이치이다.
물질적인 무소유도 그렇지만 마음의 무소유도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이 내 것인가?
촛불의 불꽃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다.
0.1초 전 틀리고 지금도 틀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도 틀리다. 즉 실체가 없다.
나의 마음도 역시 촛불과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도 매 순간 똑같은가? 모든 흘러가는 것(무상)에는 소유가 없다.
이렇게 내 것이라고 느끼는 내 마음 역시 본래는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존재 비존재이다.
마음의 생각을 아상(我想)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실체를 모르고 상대를 따라 생각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도둑 마음이라고 한다.
착한일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래야만 천국, 극락 간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아상을 떨쳐 버리지 못한 도둑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선행일까? 본래의 마음 무아(無我)를 깨닫는 것이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부처라고 느끼면 만 가지 선행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또한 무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선행은 업장을 단번에 녹일 수 없지만, 무아를 깨닫고 느껴 버리면 그 자체로서 수천 겁 생의 업장을 한순간 녹여 버릴 수 있다.
그렇기에 무소유의 본래 참된 의미는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된다는 마음도 본래 없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른 남녘 산천에 꽃을 피워 놓고, 무소유를 실천 하려고 봄에 수의도, 관도, 명정도 만장도 음식도 꽃도 조사도 영결식도 조의금도 사라도 없이 그렇게 가셨나 보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소유 121.♡.196.238
안따깝다...참안타깝다.. 측은해 보이기 까지 한다..
잠시 짬을내 책을 한번 읽어 본다면 참뜻을 이해하는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무소유...뜻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 우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잠시 짬을내 책을 한번 읽어 본다면 참뜻을 이해하는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무소유...뜻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 우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Like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