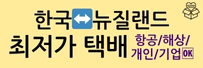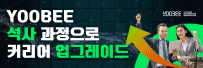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이제 우리들은 조금씩
0 개
670
22/10/2024. 13:37
오클랜드 문학회
오클랜드문학쉼터
시인 세르게이 예세닌
이제 우리들은 조금씩 떠나가고 있다.
고요함과 행복이 있는 그 나라로,
어쩌면 나도 곧 길을 떠날는지 모른다.
덧없는 세간살이를 치워야 한다.
그리운 자작나무 숲이여!
너 대지여! 그리고 너 모래벌판이어!
이러한 떠나가는 동포들의 무리 앞에
나는 괴로움을 숨길 수 없다.
너무나 나는 이승에서 사랑했다.
넋을 육체 속에 싸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를 뻗고 장미 빛의 수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미류나무에 평화가 있으라.
고요 속에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많은 노래를 지었다.
이 음울한 대지 위에서
내가 숨 쉬며 살았던 게 행복하다.
행복하다, 내가 여자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꽃을 짓뭉개며 풀 위에서 뒹굴었던 게,
그리고 나 어린 우리 동포들처럼
짐승들의 마빡을 치지 않았던 게.
나는 알고 있다, 거기서는 숲이 꽃을 피우지 않고
라이보리는 백조 같은 목을 살랑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가는 동포들의 무리 앞에서
나는 언제나 전율을 느낀다.
나는 알고 있다, 그 나라에는
안개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이러한 밭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람들이 소중하다,
나와 함께 지상에서 살고 있는.
■ 오클랜드문학회
오클랜드문학회는 시, 소설, 수필 등 순수문학을 사랑하는 동호인 모임으로 회원간의 글쓰기 나눔과 격려를 통해 문학적 역량을 높이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021 1880 850 l aucklandliterary2012@gmail.com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