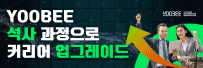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밥 한 번 먹자
문밖을 나서기 불편했던 추위가 사그라지니 거리에 발길이 늘었다. 동네 식당에도 활기가 도는 것 같다. 푸성귀가 나오기 시작하니 식당에서도 찬거리 만들기가 쉬울 것이다.

뜻밖에도 “밥 한 번 먹자”는 사람들이 늘었다. 지갑 사정이 좋아졌을 리는 만무하지만, 봄기운에 버들가지 물오르듯 힘이 날 때도 됐다. 그동안 많이 움츠리지 않았는가?
직장을 시작했던 80년대에는 물가가 싸고 먹거리가 비교적 풍성했던 것 같다. 그래서 밥 먹고 술 한잔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직장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 거의 확실했고, 해가 갈수록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 덕분에 경쟁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됐다. 직장은 마치 기차나 배를 타기만 하면 무난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입사하면 안주할 수 있는 장치였다.
직장 초년에는 선배들에게 얻어먹는 경우가 많았다. 더치페이를 몰랐던 시절이다. 나중에 후배들이 많이 생기자 내가 사는 일이 많아졌다. 선배님들에게서 얻어먹은 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샀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친다면, 나는 아주 가까운 식구가 있다. 거의 날마다 점심과 저녁을 함께한 식구다. 실은 내가 산 적은 별로 없다. 우리는 직장 근처의 소박한 식당에서 하숙생처럼 먹었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음식이 입에 맞았기 때문이다. 밥 친구도, 식당 아주머니도 어떻게 고마움을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은 직장에서 함께 밥 먹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지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김밥이나 햄버거로 간단히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함께 가도 각자 먹은 것은 각자가 내는 모양이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함께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 협조와 양보가 쉬운 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함께 밥 먹는 일이 사라지고 있단다. 일과 후 회식도 사라졌다.
나는 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을 보면 밥값을 내준 적이 많았다. 바보 같은 짓(?)이라 하겠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 어색했다. 점심값이 비쌌다면 내고 싶어도 못 냈을 것이다.
“왜 절 모르고 시주하느냐?“는 사람도 있었고, “장님이 기름값(호롱불 켜는) 내는 격”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훗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로부터 아주 친절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각인되었던 모양이다.
나는 누가 “밥 한 번 먹자”고 하면 그걸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레 “그러자”고 응대한다. 내가 남의 부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고, 남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 밥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은 “언제가 좋겠느냐”고 당장 날을 잡지 않으면 그냥 하는 소리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번 먹자”고 했으면, 날을 잡으려고 신경을 쓴다. 만나도 부탁할 일이 없으니 편하다. 필요할 때는 밥 먹자고 해놓고는 화장실 갔다 올 때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본다. 바쁘니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한다.
춥고 얼었던 겨울이 지나가니 할 일이 생겼다. 전화번호를 둘러보며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린 것이다. 나는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밥 한 번 대접해야겠다.
사는 것이 별건가? 문득 영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빨간 표지의 두꺼운 참고서 3위일체(김학기 저)가 있었다. 그 책을 펴면 29자로 된 단어가 나왔다. “월화수목금토일”의 7요일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서 이 단어에 매달렸다가 영어가 오르지 못할 산인 줄을 빨리 깨달았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단어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
발음은 “플락_시나우_시나이_힐리_파일리피케이션”이다. ‘뜬구름처럼 여기기’ 또는 ‘황금을 돌같이 보기’라는 뜻이다. 이 단어 때문에 영어를, 인생을 뜬구름 같다고 여기게 된 것일지 모르겠다. 과연 인생이 덧없을까?
일전에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여럿이 밥 먹는 자리에 숟가락 하나 더 놓겠다”고 겸양하며 말하기에 쾌히 그러자고 했다. 나를 생각해서 전화했는데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냥 즐겁게 봄나들이 가는 것이다. 밥은 누가 사면 어떠리?
만나서 “어색(語塞)하다”는 것은 말이 막힌다는 뜻이다. 그것은 내가 경청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다. 자랑이건 넋두리건 편하게 말하도록 하고, 듣는 것도 기술이며 즐거움이다. 세월의 간극만큼 사람들도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 했다.
* 출처 : FRANCEZONE

■ 조 기조(曺基祚 Kijo Cho)
. 경남대학교 30여년 교수직, 현 명예교수
.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 기고
.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출간 (공저)
. 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비상근 이사장으로 봉사
. kjcho@uok.ac.kr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