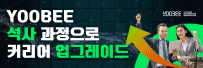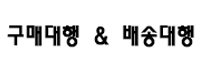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맑은 차 한잔에 담긴 선의 경지를 엿보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최상의 옥과 같이 맑은 차 한잔, 과연 그 차는 얼마나 특별했기에 한 잔에 겨드랑이에 바람이 일고 선경에 이르렀을까. 달과 구름조차 찻자리를 밝히는 배경이 되어줄 정도니, 궁금할 법도 하다. 초의선사(1786~1866)가 사랑했던 그 특별한 차를 만나기 위해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 두륜산 대흥사로 향했다. 대흥사는 백제시대 창건된 천년고찰로 한국 차문화의 성지 일지암이 부속암자로 있다. 일지암은 초의선사가 말년까지 40년을 주석하며 『동다송』과 『다신전』을 집필한 곳이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초의선사는 우리나라 차의 맥을 중흥시킨 성인, 즉 다성(茶聖)으로 지칭되니 그 상징성이 지금도 오롯이 전승된다.
3월 초봄, 서울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 걸려 당도한 대흥사는 서늘한 날씨에도 이미 매화가 만개했고, 일지암은 아직 나무의 새순이 돋기 전인데 도량 내 차나무밭만이 초록의 기운을 가득 머금었다. 찻잎을 따는 절기 곡우(穀雨, 4월 19일)까지 한참 남았으니, 햇차가 나오기엔 이른 시기다.
대흥사에 들어서자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법은 스님이 반가운 인사로 객을 맞는다. 경내는 이미 봄을 찾아 전국에서 온 상춘객들로 붐볐다. 초의선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길인 만큼, 부도탑으로 분주한 걸음을 옮겼다. 경내 진입로 왼편 부도전에 모셔진 수많은 부도탑 가운데 초의선사 부도가 있다. 이곳에 모셔진 부도는 무려 56기, 대흥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도가 모셔진 사찰이기도 하다.

부도전을 참배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 대흥사로 향하는 걸음 곳곳에서 변화가 포착된다. 진입로부터가 산책로로 차근차근 변모하는 중이다. ‘천년숲 옛길’을 시작으로 ‘길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구간별 특색을 살린 가운데, 사색을 위한 산책코스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초의선사로부터 이어진 차문화의 전통을 복원하고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이미 지난해 차를 덖는 덕장을 새롭게 정비했고, 더 많은 대중들이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문화체험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덕장에서 만드는 차는 ‘대흥관음녹다’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만난다. 탱화장터로 불리던 ‘마전밭’도 인근 차밭과 연계해 정비될 예정이다.
‘대흥관음녹다’라는 명칭은 새롭게 지어졌지만, 사실 대흥사에서 차를 만드는 전통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매년 곡우를 전후해 대흥사 스님들은 야생차밭에서 딴 찻잎을 며칠간 꼬박 덖어 녹차를 만들었다. 대흥사가 관리하는 차밭은 일지암을 포함해 7곳가량. 무려 3만 평 남짓 규모다. 1년 중 가장 정성을 기울이는 대대적인 울력이지만, 만드는 차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아 주로 사중에서 의식에 공양 올리거나 스님들이 음용해 왔다.

초의선사의 제다법에 근거해 어른 스님들이 기억하고 전승해 온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차를 만드는 과정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차를 만든 경험이 있는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그 해의 차 맛을 진두지휘한다. 제일 처음 완성된 차는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을 비롯한 어른 스님들이 맛을 보고, 차 덖는 온도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더하기도 한다.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야생 찻잎을 전통 제다법에 따라 정성으로 덖어낸 만큼, 그 맛과 기운은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다.
그날 딴 찻잎은 당일 덖는 것이 원칙이다. 제다의 과정으로 살청과 유념, 건조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살청은 고온에서 찻잎이 타지 않게 수없이 덖어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무려 280℃ ~350℃ 고온의 가마솥에 손을 넣은 채 5~10분 이어지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순간의 열을 감지해 수없이 손으로 돌리며 덖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으로 쌓인 감각과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덖어낸 찻잎을 광목천 위에 펼쳐내어 손으로 비비는 작업은 유념의 과정이다. 광목천에 올린 찻잎을 두 손으로 강하게 비비다 보면 찻잎에 미세하게 붙어 있던 하얀 털들이 진액처럼 뭉쳐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차의 독성이나 강한 성분이 빠진다. 유념을 끝낸 찻잎을 건조한 후 다시 약한 불로 덖는 가향 작업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는다.
차를 우리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 보통 녹차를 우릴 때 물을 끓인 후 70℃~80℃ 정도로 식히는 것과 달리, 대흥사의 녹차는 뜨거운 물로 우린다. 그래도 떫지 않으며 맑고 담박한 맛과 향이 은은하게 감돈다. 이것이 대흥사가 계승한 초의차의 전통 제다법의 핵심이다. 맛이 뛰어난 만큼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몇 날 며칠 쉼 없이 차 울력에 매진하고 나면 손끝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고되다.

햇차가 나오기 직전의 이른 봄은 차의 춘궁기여서 객은 결국 ‘대흥관음녹다’의 맛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쉬운 마음 안고 일지암으로 발길을 옮겼다. 대흥사에서 도보로 한 시간 남짓, 차량으로는 15분 정도지만 깎아지른 듯한 경사가 예사롭지 않다. 일지암에 당도하자 탁 트인 풍경이 숨통을 틔운다. 초의선사가 머물렀다는 초정을 등지고 두륜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햇빛이 닿는 곳마다 차나무로 가득하다. 진초록의 광택을 머금은 찻잎 하나하나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그 생명력을 한껏 드러내는 듯하다.
39세 초의선사는 이곳에 한 칸의 띠집을 지어 일지암이라 이름 짓고 말년까지 40년을 머물렀다. 차나무 씨앗을 심고 차를 재배했으며 돌 틈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백운천이라 칭했다. 차를 덖고 만들고 샘물로 차를 우려 마셨으며 수행 정진으로 삼매에 들기도 했다. 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차의 경전이라 칭해지는 『동다송』과 『다신전』도 이곳에서 집필했다. 차를 매개로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과 남다른 교우도 이어졌다. 시대를 풍미했던 두 유학자와 초의 사이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특히 제주에 유배간 추사 김정희가 초의선사의 차를 조르는 편지를 보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전하니 흥미롭다. 일지암 초정에서 초의선사가 만들었다는 연못을 향하는 석축에 다감(茶龕)이라고 새겨진 돌 하나가 무심히 놓였는데 초의선사의 글자를 새겼다고 전해진다.

차의 춘궁기라 마음 비운 덕인지 일지암주 법경스님이 내어주신 녹차를 맛볼 수 있었다. 과연 맑고 청명한 탕색에 향과 맛이 달고 깔끔해 한 모금 넘기자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듯하다. 어느 순간 겨드랑이에 바람이 일었을지도 모르겠다.

“차는 혼침과 산란을 막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면서 정신을 깨우죠. 스님들이 차를 가까이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선일여(茶禪一如), 차와 선이 같음을 차를 마시는 순간마다 느낍니다.”
초정의 문을 열고 찻자리를 이동했다. 일지암주법경 스님과 대흥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법은 스님은 도반이다. 편안한 웃음과 담소가 이어지다가도 차 한 모금 머금는 순간엔 잠시 시간이 멈춘다.
초의선사는 『다신전』에서 차를 마실 때 “홀로 마시면 신령스럽고[神], 둘이 마시면 좋은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勝], 서너 명은 즐겁고 유쾌하고[趣], 대여섯은 평범하고 구속받지 않으며[泛] 일고여덟명은 그저 나누어 마시는 것[施]”이라 했다.

차 한잔 머금은 순간 스님들의 겨드랑이엔 바람이 일었을까? 아니면 좋은 정취를 느꼈을까? 객에겐 그리 중요치 않다. 대흥사, 그리고 일지암에서 스님이 사랑한 차 한잔 엿본 것에 만족할 뿐이다.
일지암을 떠나는 길, 곡우가 지날 무렵 다시 이곳을 찾아 ‘대흥관음녹다’를 기필코 맛봐야겠다는 결심이다.
■ 두륜산 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799)
061-534-5502~3 l http://www.daeheungsa.co.kr
■ 출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매거진(vol.65)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