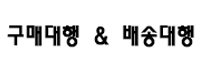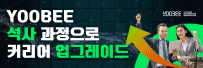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계약법 (contract law) 주요 분쟁
뉴질랜드 법을 비롯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는 계약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상업활동을 하다보면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를 성립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로인해 계약법 안에서만 그런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해석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지, 어느쪽이 위반한 것인지,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책정하는것이 맞는지 등 너무나도 광범위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상업리스 (commercial lease), 고용법, 가족관계 (재산분할) 등 다양하게 응용되어 발전되었구요.
아무리 양측 다 변호사를 써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에 관련한 해석 문제의 여지는 종종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서 작성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는걸 완벽하게 파악하며 계약서가 작성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연히 더더욱 그렇구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법에서 흔히 일어나는 주요 분쟁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가장 흔한 것은 단순 계약위반입니다. 특히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약 분쟁이라기 보다는 채무 불이행 (혹은 debt recovery) 이라는 별도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 위반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미리 계약조항으로 다루어두면 좋습니다. 예를들어 “계약 위반한 쪽은 집행하는 쪽의 변호사비 100%를 지급한다”라고 동의를 해 놓으면 높은 확률로 (법원의 재량권 때문에 항상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쪽에서는 100% 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해질겁니다.
또한 담보 (security) 혹은 보증인 (guarantor)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중요합니다. 대부분 상업리스에서의 임대인들 (landlords), 은행 및 finance company 등 힘이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이런걸 주장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담보가 있는 걸 알고 내가 딱히 계약이 취소되어도 손해볼 일이 없는거라면 당연히 주장하는게 좋겠지요.
두번째, 계약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소위 ‘1인 법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은 혼자 운영하던 아니던 최대한 나와는 별개 취급을 하는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을거면 그냥 개인 이름으로 (sole trader) 비즈니스나 상업행위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방법은 법인 이름보다도 개개인을 믿고 진행하는 만큼 개인의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어 Party: Seungmin Kang of ABC Limited). 계약서 서류 혹은 계약활동 상 다른 요소도 살펴봐야겠지만 굉장히 애매해질겁니다.
또한 회사를 대표해서 사인을 할 때에도 그냥 “Seungmin Kang” 이렇게 이름만 놓고 사인을 하게되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계약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Signed by “Seungmin Kang as a director of ABC Limited” 이런식으로 내 개인으로 계약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법인을 대표해서 하는거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은, 피고를 잘못 설정하여 소송을 시작하면 조기에 strike-out이 되어버릴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은 멀쩡하게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한건데 내가 혼자 오해해서 상대방 회사의 director를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분을 잘 노려서 상대방의 법인이 자산도 없는 빈 깡통인데 상대방 개인은 자산이 많아서 집행이 쉬울 것 같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법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석이 보인다면 그 부분을 노려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구요.
세번째, 법적 조항으로 인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사인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계약서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그렇고, 또한 부부간의 혼전계약 혹은 재산분할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후자는 양측이 각각 변호사들까지 사인을 하여야 함).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너가 구두로 이 집 나한테 팔기로 하지 않았냐”라는 주장은 거의 무효에 가깝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특히 양측 다) 구두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까지 어느정도 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뒤 A의 부동산을 B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1m에 넘기기로 계약하면서 그 조건으로 B가 A 집에 미리 들어가서 미리 살면서 집 수리를 전부다 하기로 한다, 그리고 A도 B가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B도 집 수리를 시작한다면, 게다가 위 구두계약과 관련된 서면이 조금씩이라도 존재한다면 (카톡으로 “3년”, “$1m” 언급하는 등) 구두계약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misrepresentation (부실표시) 입니다. 한 쪽에서 (특히 계약 대상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쪽) 계약 대상에 대해 사실이 아닌 표현을 썼다면, 다른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현재 농장을 운영중인 A가 농장을 구입해서 처음 운영해보려는 B에게 “이 땅에서는 옥수수가 100만그루씩 자랄 수 있다”라고 확답을 주었고 그것에 기반해 $1m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50만그루씩밖에 자랄 수 없었다면 그에 맞는 (예를들어 $500,0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며 땅 가져가고 원래 지급한 $1m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해석 이견 (interpretation) 혹은 암묵적 조항 (implied term)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는 1, 3, 5를 가지기로 했고 B는 12, 14, 16을 가지기로 했는데 17이 나왔다면 A쪽에서는 “계약서 해석 상 홀수는 다 내꺼라고 볼 수 있으니 내꺼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것이고, B는 “계약서 해석 상 10 이상의 큰 숫자는 다 내꺼라고 볼 수 있으니 내꺼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계약서의 해당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 혹은 당사자들의 이전 계약이나 이후 계약, 심지어 양측이 주고받은 모든 서신들까지 들춰보면서 “당사자들이 계약당시 17이 나올걸 알았다면 어떻게 계약했을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게 전부는 아니고, 그나마 대표적인 분쟁 사안들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변호사를 처음부터 쓰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돈이 조금 들겠지만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시어 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