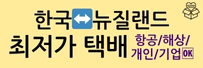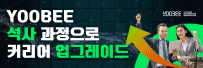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내 마음의 당간지주
0 개
1,459
24/03/2021. 16:08
오클랜드 쉼터
오클랜드문학쉼터
당간지주 앞에 눈길을 놓는다 오랜 날들
한때 숲을 이루었고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간
여기까지 밀려와서 세상의 흥망을 읽으려 하다니
깃발을 올려 손짓할 수 없는 날들
나도 한때 펄럭여보고 싶었다
마음의 당간지주 나 이미 버린지 오래였으나
독하게 일별한 것들이 비쭉비쭉
이제 와서 고개를 내밀다니
때로 무너지고 싶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어
한번쯤 지독하게 무너지고 나서야
결국 은산 철벽 막다른 나를 알고 나서야
문득 실려오는 매화꽃 향내음
그래 강물만이 흐르는 건 아니지
당간지주 앞에 오래 머물렀다
해묵은 빚처럼 내미는 것들을 비로소 세워놓는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도리질을 치며 쏟아내는 내 마음의 고해성사
노을이 한쪽 산자락을 가만히 끌어내려
아린 눈 내리쓸어 감겨주는가
메아리만 아득하구나 저 허공
머리 푼 마음이 먼 산을 넘는다
시인 : 박 남준

■ 오클랜드문학회
오클랜드문학회는 시, 소설, 수필 등 순수문학을 사랑하는 동호인 모임으로 회원간의 글쓰기 나눔과 격려를 통해 문학적 역량을 높이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021 1880 850 aucklandliterary2012@gmail.com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