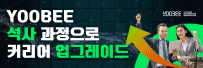|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어떤 종이컵에 대한 관찰 기록
0 개
1,170
10/11/2021. 14:34
오클랜드문학회
오클랜드문학쉼터
시인 복 효근
그 하얗고 뜨거운 몸을 두 손으로 감싸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듯
사랑은 이렇게 달콤하다는 듯
붉은 립스틱을 찍던 사람이 있었겠지
채웠던 단물이 다 비워진 다음엔
이내 버려졌을,
버려져 쓰레기가 된 종이컵 하나
담장 아래 땅에 반쯤은 묻혀 있다
한때는 저도 나무였던지라
낡은 제 몸 가득 흙을 담고
한 포기 풀을 안고 있다
버려질 때 구겨진 상처가 먼저 헐거워져
그 틈으로 실뿌리들을 내밀어 젖 먹이고 있겠다
풀이 시들 때까지나 종이컵의 이름으로 남아 있을지
빳빳했던 성깔도 물기에 젖은 채
간신히 제 형상을 보듬고 있어도
풀에 맺힌 코딱지만한 꽃 몇 송이 받쳐들고
소멸이 기꺼운 듯 표정이 부드럽다
어쩌면 저를 버린 사람에 대한
뜨거웠던 입맞춤의 기억이
스스로를 거듭 고쳐 재활용하는지도 모를 일이지
1회용이라 부르는
아주 기나긴 생이 때론 저렇게는 있다.
■ 시인 복 효근
(복효근·시인, 1962-)

■ 오클랜드문학회
오클랜드문학회는 시, 소설, 수필 등 순수문학을 사랑하는 동호인 모임으로 회원간의 글쓰기 나눔과 격려를 통해 문학적 역량을 높이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021 1880 850 aucklandliterary2012@gmail.com








































































































































![유트브: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 채널 운영
사진여행, 트래킹여행, 캠퍼밴 동호회 진행
캠퍼밴 렌트대행, 여행상담
캠퍼밴트래블(주) 캠트여행사 대표](/img/columnlist/photo_20210112105536.jpg)